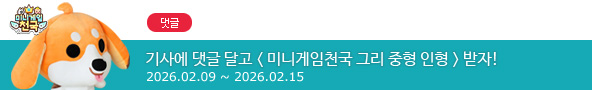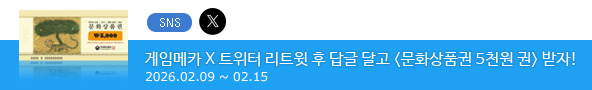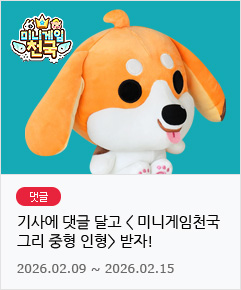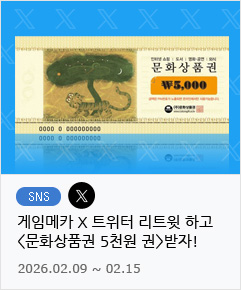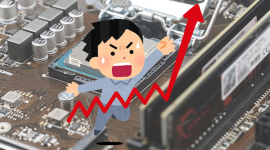2015년 국정감사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가장 많이 지적된 이슈 중 하나는 자율심의 사후관리 부실이다. 한국의 경우 오픈마켓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에 한해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데, 게임위가 사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지적됐으니 2016년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 지난 25일 열린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발대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 비교자료
(자료출처: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

▲ 지난 25일 열린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발대식 현장
(사진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년 국정감사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가장 많이 지적된 이슈 중 하나는 자율심의 사후관리 부실이다. 한국의 경우 오픈마켓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에 한해 자율심의를 진행 중인데, 게임위가 사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2015년에 이 문제가 지적됐으니 2016년에는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해야 하는 것이 옳은 수순이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2016년에는 2015년보다 모니터링 요원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게임위는 지난 25일,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및 불법 게임물 모니터링단을 출범시켰다. 문제는 인원이다. 작년에는 40명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5명으로 줄었다. 투입되는 인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게임위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2015년 게임물등급분류 및 사후연감에 따르면 2014년 게임 심의 중 99%는 모바일이다. 건수로 따지면 519,331건인데 이러한 경향이 올해에도 이어질 경우 15명이 이 많은 건수를 감당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바일게임은 국내 주력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타 장르에 비해 대중에 노출되는 빈도수가 높다. 이러한 모바일게임 자율심의에 구멍이 생겨 지나치게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게임이 많이 공개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지적된다면 ‘게임은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더욱 더 강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모바일게임 자율심의 부실은 2014년부터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지목되고 있다. 2015년에도 이상일 의원, 서용교 의원 등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상일 의원은 연령등급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 게임에 요청한 등급변경요청 중 15%만이 반영된 점을, 서용교 의원은 모니터링 건수가 한국에 출시된 모바일게임의 5%에 불과함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모니터링 인원을 늘릴 것을 요구했으며,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역시 손이 부족함을 어필한 바 있다.
이처럼 국정감사에서 ‘모바일게임 사후관리 강화’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교감이 있었음에도 올해 그 인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예산에 있다. 실제로 2015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예산은 58억 2,900만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5억 2,000만 원이 줄어 53억 900만 원이 집행됐다.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사후관리 강화’와 관련 인원을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예산이 도리어 줄어든 배경은 무엇일까?

▲ 게임물관리위원회 2015년 예산과 2016년 예산 비교자료
(자료출처: 문체부 공식 홈페이지)
게임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물론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한 의원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일단 문체부의 경우 국정감사 당시 이야기된 ‘모니터링 강화’를 의식해 증액을 원했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조정 과정에서 게임위에 투입될 예산은 줄어들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추진해야 할 사업은 많기에 각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게임위에 투입될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다.
국회에서도 증액 시도는 있었다. 국정감사 당시 ‘모니터링 부실’을 지적한 의원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이 상임위 단계에서 통과됐으나 이를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이 반영되지 않아 전년보다 줄어든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한 것이다. 문체부는 “사후관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어필해봤으나 아쉽게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 주세요

초심을 잃지 말자. 하나하나 꼼꼼하게.risell@gamemeca.com
- [오늘의 스팀] ‘압긍’ 받는 요리판 발라트로, 정식 출시
- 문화적 공로, 33 원정대 개발진 전원 기사 작위 받았다
- 10주년 맞은 스타듀 밸리, 1.7에서 결혼 후보 2명 추가한다
- 아이작의 번제 개발자 신작 ‘뮤제닉’ 메타크리틱 90점
- 영상 조작해 폐급 용사를 영웅으로, '저 못 믿으세요?' 출시
- 명일방주: 엔드필드, 출시 2주 만에 매출 2,500억 원 달성
- ’스팀 평균‘ 국민 PC 맞추는 데 226만 원, 1년 새 2.5배 ↑
- 레이싱게임 '레이시티' 스팀 페이지 오픈, 진위 여부 화제
- 엔씨의 허술함 노린, 리니지 클래식 젤 무한 생성 사태 발생
- 우리 우정 영원히, 살인사건 은폐하는 협동 게임 등장
게임일정
2026년
02월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